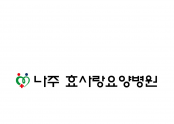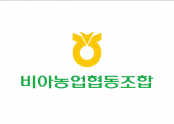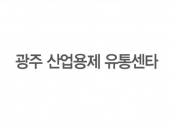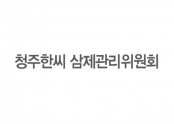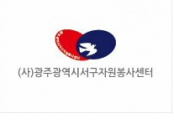전남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빈장례문화원 작성일17-08-14 13:27 조회3,573회 댓글0건본문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2636400529850063
| 요일특집 > 기고 |     |
유명한 소설 죄와벌을 쓴 토스토 예프스키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다는 사실이다.그러니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모든 생명체의 끝은 죽음이므로 인간의 생명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되므로, 살아 생전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아름답게 준비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바쁜 세상엔데, 언제 찾아 올지도 모르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란 퍽이나 힘들다. 더더욱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 익숙해 한다. 혹 주위에서 젊은 나이에 병마와 싸우면서 죽음과 대면하는 것을 보든지 어린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는 사고사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소수의 불행한 사람으로 여긴다. 정작 본인 또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낯설어 한다. 본인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죽음이란 가까이 있거나 조금 멀리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사람이 죽어서 치러지는 장례란 습,염 등 과정을 거처 관에 입관하여 매장할 때 까지를 통틀어 행하는 장사가 장례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정착 된 전통적으로 유교적 장례를 따르고 있는데 장례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갖추어 부음부터 탈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유교식 매장을 하는 것이 대표적 장례문화로 여겨진다. 현대의 장례는 불교식,유교식,기독교식,천주교식 상례들이 서로 섞여있는 형태로 장례문화가 변천되어 가고 있다. 옛날에 비해 장례절차와 형식이 많이 간소화 되었다 무엇보다 망자를 보낸 이들의 곡소리를 보기가 힘들어 졌으며, 꽃상여에 고인을 어깨위에 메고 후손들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망자를 모셨지만 이제는 고인 전용리무진이 고인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더 달라진 것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급속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장례문화원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1970년대 까지 거소(자택) 장례문화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조문객들은 집으로 조문을 가서 상주와 유족을 위문하였으며 상주와 유족들은 조문객을 접대하고자 집 앞 인도나 도로, 마을회관이나 아파트주차장등에 천막을 치고 조문객을 맞이하였다. 조문객은 유족과 함께 밤샘을 한다든지 조문객들 끼리 화투를 치며 함께하면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이웃간에도 서로 양해하고 슬픔을 양보로 위로하던 품앗이 문화시대였다. 1980년대부터 자택장례의 번거로움 때문에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였고 이 무렵에 전문 장례식장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일본으로부터 성행한 상조문화가 흘러 들어와 상조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장례문화도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서비스의 질적,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요즘 장례식장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뛰어나다. 조문객 규모에 맞도록 다양한 평수의 분양소를 마련하고 테라스에 유족의 휴게실, 에스컬레이터, 커피숍, 인공폭포, 대형주차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해 장례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각종 조명과 음향장비를 이용해 발인식장 내 분위기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족의 심정에서 예를 다하고 있어 혐오시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살고 싶은지를 물으면 보통 자신의 나이에 30-40년 정도를 더한 만큼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결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들 한다 어른신들께서 "이제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느낄수 있다. 오늘 100세가 지났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바램대로 성장해 주었다고 해서, 또 내가 바라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지금 죽어도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해도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 할 것이다 .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는지 진지하게 명상에 잠겨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이민영 국빈장례문화원 회장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